자유게시판

- 커뮤니티
- 자유게시판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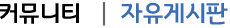 보라,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!
보라,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!
(시편 133편 1절)
- 유아(有兒)조회수 : 12794
-
- 작성자 : 김상진
- 작성일 : 2015년 8월 31일 23시 36분 54초
-
어떤 아이 둘이서 걸어가는데
동생은 쌍상투하고 누이는 묶은 머리 했네
동생은 말을 배울 나이고
누나는 다박머리 드리웠네
어미를 잃고 우는 저 두 갈래 길에서
붙잡고서 연유를 물으니
흐느껴 울며 말을 못하네
울면서 말하길, 아빠는 오래 전 떠났고
엄마는 짝 잃은 신세였어요
쌀독은 벌써 비어서
사흘이나 굶었어요
엄마는 저를 안고 흐느껴 울며
눈물 콧물 두 뺨에 얼룩졌어요
동생은 울면서 젖을 찾았지만
젖은 말라서 붙어버렸어요
엄마는 제 손을 잡고
이 젖먹이를 업고서
저 산골에 가서는
구걸하여 먹였어요
어시장에 이르러서는
제게 엿도 먹여줬어요
이 길까지 데리고 와서는
동생을 사슴 새끼 품듯 안고 잤어요
동생은 세상모른 채 잠이 들었고
저 역시 죽은 사람처럼 잠들었어요
문득 깨고 나서 보았더니
엄마는 여기 없었어요
말하다가 울다가
눈물 콧물 줄줄 흐르네
날 저물어 어두워지면
새들도 집을 찾는데
외로운 두 오누이
찾아갈 집이 없구나!
슬프다! 이 나라 백성들
하늘의 떳떳함마저 잃었구나!
지아비와 지어미가 사랑하지 못하고
엄마도 제 자식 돌보지 않네
옛날 내가 마패 갖고 암행어사 되었을 때
당시가 갑인년(甲寅年)이었는데
임금님 분부하셨지, 고아들을 보살펴서
고생 없게 하라고..,
모든 벼슬하는 관리들아!
이 말씀 감히 어기지 말지어다
지금으로부터 약 220년 전, 조선후기. 절대빈곤으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되는 지경을 한탄하며 다산(茶山)이 지은 시(時)입니다. 다행히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절대빈곤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그 대신 말씀의 빈곤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인지, 또 마치 이 시가 오늘날의 기독교를 풍자하고 있는 듯해서 인지 시(時)를 읽고 또 다시 읽는 내내 마음 한 켠이 에려옵니다.
바른 말씀으로 많은 혼들이 회심하며,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같은 소망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혼들이 더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, 다산 선생님의 시(時) 한 수와 함께 글을 공유해봅니다.


